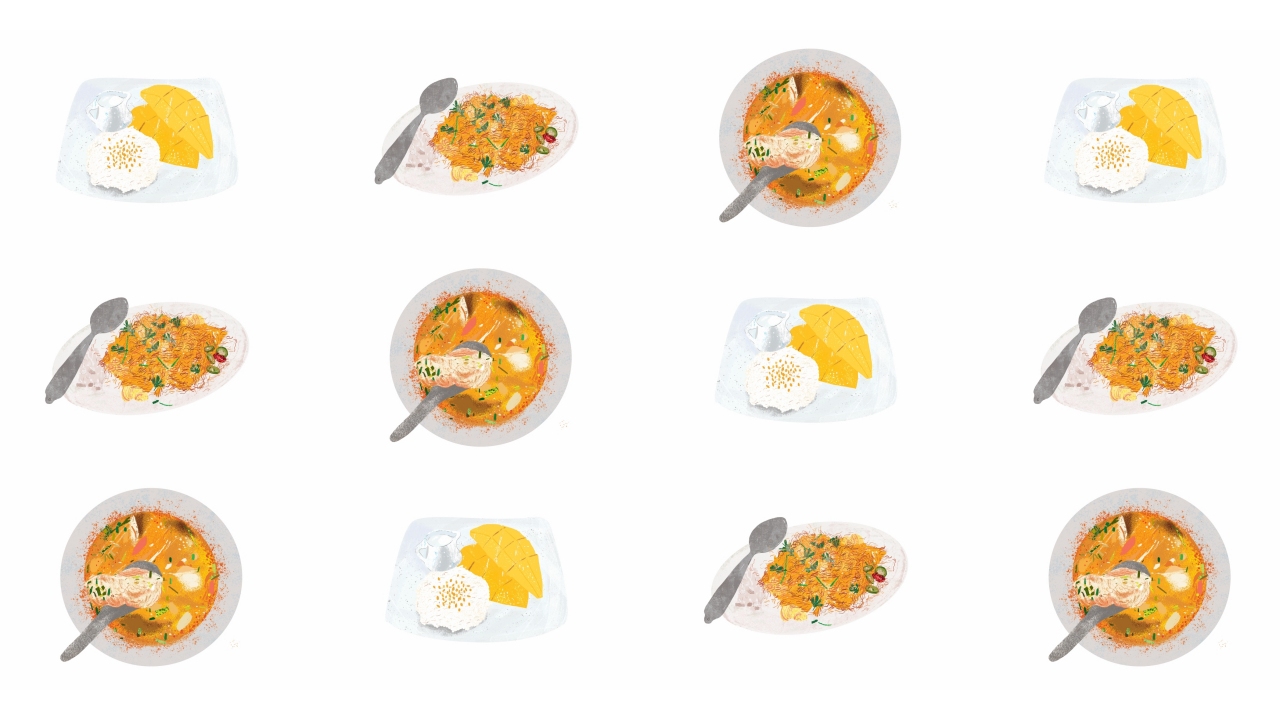브뤼셀 중앙역 산책
최근 ‘지속 가능한 여행’을 위해 기차에 오르는 이들이 늘고 있다. 2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열차편이 있는 경우 항공 이용을 금지한 프랑스와 2050 기후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유사 정책을 검토 중인 스페인 등 철도 여행에 대한 유럽 내 인식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
벨기에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먼저 철도가 건설된 나라다. 1835년 브뤼셀을 시작으로, 1840년 오스텐데(Oostende), 겐트(Gent), 브뤼헤(Brugge), 안트베르펜(Antwerpen)까지 확장돼 1843년 벨기에를 동서와 남북으로 잇는 노선이 완공되었다. 오늘날 3,607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로는 벨기에 전역을 촘촘하게 잇는다. 초여름, 파리 북역에서 벨기에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파노라마로 스치는 푸른 지평선을 두 시간 남짓 눈에 담다 보면 브뤼셀 중앙역에 다다른다.
최근 ‘지속 가능한 여행’을 위해 기차에 오르는 이들이 늘고 있다. 2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열차편이 있는 경우 항공 이용을 금지한 프랑스와 2050 기후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유사 정책을 검토 중인 스페인 등 철도 여행에 대한 유럽 내 인식의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
벨기에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먼저 철도가 건설된 나라다. 1835년 브뤼셀을 시작으로, 1840년 오스텐데(Oostende), 겐트(Gent), 브뤼헤(Brugge), 안트베르펜(Antwerpen)까지 확장돼 1843년 벨기에를 동서와 남북으로 잇는 노선이 완공되었다. 오늘날 3,607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로는 벨기에 전역을 촘촘하게 잇는다. 초여름, 파리 북역에서 벨기에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파노라마로 스치는 푸른 지평선을 두 시간 남짓 눈에 담다 보면 브뤼셀 중앙역에 다다른다.